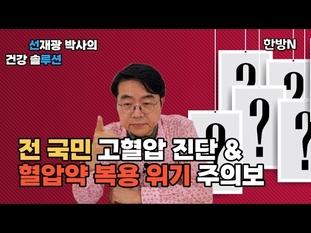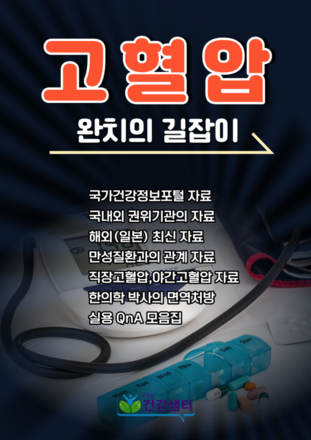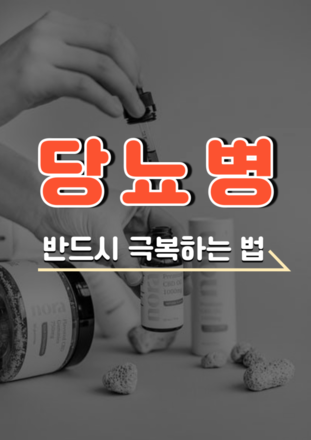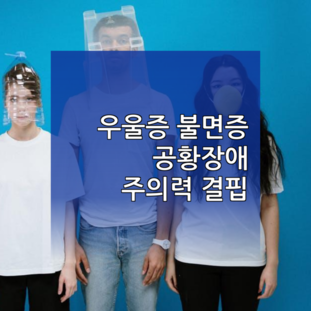국내 연구진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고품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배양 기술을 개발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쓰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와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공동 연구진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간의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제노 프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줄기세포는 다른 종류의 세포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 배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배아줄기세포, 성장이 끝난 사람에게서도 남아 있는 성체줄기세포, 사라진 줄기세포의 능력을 다시 회복한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신체 장기를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줄기세포를 키우는 배양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 줄기세포는 배양하는 데 다른 동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면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생산 공정에 따른 품질

보통 독감 백신은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접종 후 2주에서 한달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완벽한 바이러스 보호 효과를 제공하진 않는다. 건강한 성인 기준 백신의 예방률은 70~90%에 이르고 노인의 경우 노인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해 독감과 관련된 합병증을 50~60% 감소시킬 수 있다.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특히 항체 생산능력이 낮은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항원 함량을 높여 백신 예방률을 높인 고용량 독감 백신이 상용화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지어, 일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도 고용량 독감 백신(인플루엔자 백신)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량 독감 백신은 항체 역가가 더 많이 증가하는 등 반응률이 올라갔지만 심폐 관련 입원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알렉산더 페이커트 등이 진행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고용량 독감 백신 접종의 면역 반응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게재됐다.

아스피린이 암세포를 감지하고 면역반응을 강화해 대장암 발병과 진행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파도바대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들의 조직 샘플을 채취해 아스피린 복용 여부와 대장암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미국암학회(ACS) 학술지 암(Cancer)에 최근 게재됐다. 아스피린이 다양한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껏 여럿 나왔다. 아스피린을 매일 장기간 복용하면 대장암 발병률과 사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작용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015~2019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38명으로부터 조직 샘플을 채취해,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12%)와 나머지 비복용자 간 조직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의 조직 샘플은 림프절로 암이 전이되는 빈도가 비복용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면역세포의 종양 침투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피린 복용자들의 경우 건강한 직장 점막 조직에서 종양 관련 단백질의 존재를 감지해 다른 면역세포에 경고를 보내는 CD80 발현율이 비복용자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의 연구는 염증 억제와 관련

한국의 간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국내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례 중 간암이 12.2%를 차지한다. 간암 환자는 대부분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질환이나 간경변증을 갖고 있다. 또한 종양의 위치나 크기, 전이 여부뿐 아니라 남은 간 기능 등 고려할 요소가 많고 치료 방법이 다양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의료진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수술 △고주파 열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한다. 다만 치료 방향 설정과 생존율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김강모·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 △고대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9개 기관에서 2010~2012년 간암을 진단받고 다양한 치료를 받은 환자 2685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 결과, ‘치료 예측 정확도’는 서울아산병원 내부 및 외부 데이터셋에서 각각 87.27% 및 86.06%를 기록했다. 생존 예측 정확도 역시 91.89%와 86.48%로 높은 진단 성능을 보였다. 이후 환자들의 △기본 임상정보 △암 진단 후 처음 받은 치료의 종류 △치료 이후의 생존 데이터를 수집해 병원 별로 나누어 인공지능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