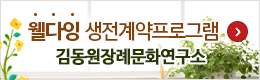북한은 1993년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 있는 무덤을 발굴, 두 사람분의 인골을 발견하고 이를 단군과 그 부인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연대측정을 통해 인골이 5천11년 전의 것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학계가 단군릉에 역사성을 부여하면서 북한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우리 학계는 단군릉과 그곳에서 발견된 인골의 진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군묘에 대한 기록은 조선 전기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실려 우리에게 전해졌다. 조선시대만 해도 단군이 묻혔다고 전해진 무덤은 능(陵)보다 하위 개념인 묘(墓)로 불렸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성립하면서 기자릉이나 동명왕릉의 예에 따라 순종이 조서를 내려 비로소 단군릉으로 불리게 됐다. 단군에 대한 저서와 논문을 여러 편 내놓은 김성환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최근 "조선시대 단군묘 인식", "일제강점기 단군릉수축(修築)운동"(이상 경인문화사 펴냄) 등 2권의 저서를 함께 출간했다. 그는 이 책들을 통해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과 그의 무덤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인식됐는지를 살폈다. 조선시대에 단군묘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다는 취신론(取信論)과 불신론이 있었는데, 취신론자들은 복수의 단군묘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17세기 중엽 허목은 단군이 역사적 존재임을 확신하고 이를 토대로 "단군세가"를 저술했으며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는 단군묘를 장수왕 이후의 고구려 왕릉으로 추측했다. 한말 국사 교과서인 "대동역사", "동국사략", "신정동국역사" 등에서는 단군릉을 역사적 사실로 서술했다. 저자는 신채호가 단군릉을 이해하는데 근대역사학적 해석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신채호는 단지 단군묘의 존재만을 인식했던 박은식과는 달리 정복 군주로서의 측면을 부각시켜 단군이 원정 도중 강동에서 사망한 까닭에 단군릉을 강동에 조성했다고 서술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일제강점기에는 단군릉을 역사적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단군릉을 보수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