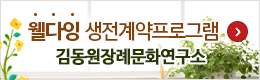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 ●아키타현 최고(最古) 사찰 조라쿠지 주지인 사카마토 기주(74)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2∼3년 사이 신자들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 서기 860년쯤 세워진 이후 신도들의 발이 끊이지 않았던 건 그야말로 ‘좋았던 옛날 얘기’다. 노인 요양소도 개업하고 2년 전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키타시 교외에 새 사찰도 지었지만 허사였다. 신도 수는 겨우 60여가구에 불과하다. 근처 오가 지역 주이코지 사찰 주지 승려인 모리 료코(48)의 사정도 마찬가지다.700년 역사에 거느린 승려만도 21명이지만 신자 수가 줄어만 가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 불교가 다음 세기까지 살아남을지 걱정될 정도”라고까지 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일본 최대 종교였던 불교가 대중적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집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비율이 늘면서 덩달아 승려들의 지위도 휘청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불교는 ‘장례 불교’라고까지 불리며 일본인들의 일상사에 깊숙이 자리해왔다. 승려가 생의 마지막 관문인 장례식을 주재하고 사찰에 위패를 모시는 등 불교가 장례 문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기 때문이다. 1992년엔 일본 국민의 62%가 장례식을 사찰이나 집에서 치렀다. 그러나 지난해엔 국민의 61%가 장례식장을 선호한 반면 사찰, 집에서 장례를 치른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장례식을 생략하고 바로 화장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한 것도 이유다. 불교전문가이자 인류학자인 우에다 노리유키는 “일본 장례문화에서 불교 승려와 사찰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문화청에 따르면 2000년 8만 6586개였던 사찰은 2006년 8만 5994개로 감소했다. 신도 수도 감소했다. 제2차 대전 뒤 사찰들은 목숨을 잃은 군인들에게 사후 법명을 하사했다. 그 뒤 일반인들도 동일한 법명을 받기 위해 장례식에 돈을 쏟아부으며 불교가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러나 사후 법명에 몇천달러씩 쏟아붓는 허례허식은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승려들은 먹고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신도 170여가구를 거느린 고가쿠인 사찰 교콘 스님은 “사찰 하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보육원에 새로 일자리를 얻었고 남편은 최근 지방 토지계획사무소에 취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