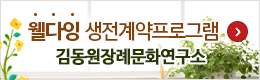지난 2년 여 기간동안 인간의 죽음과 주검의 가치가 본의 아니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쩌면 안락사, 존엄사 문제가 급부상한 계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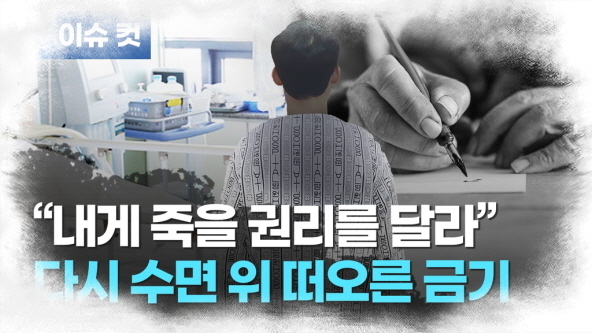
최근 안락사를 두고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조력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법안 발의가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16일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콜롬비아 칼리에 사는 빅토르 에스코바르가 2022년 1월7일(현지시간) 안락사 시행 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스코바르는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됐고,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고혈압·당뇨 등을 앓으며 10년 이상 인공호흡장치와 약에 의존해왔다. [사진=뉴시스]](http://www.memorialnews.net/data/photos/20220728/art_16578570450581_54d6ca.jpg)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죽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고, 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력 존엄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말기 환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참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고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 바젤까지 온 영국 출신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br>
2018년 5월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www.memorialnews.net/data/photos/20220728/art_16578570452109_9b06bc.jpg)
'웰다잉 문화 정착이 먼저다' 주장
‘조력 존엄사’ 문제는 우리 만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다. 영국의 경우 조력 존엄사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캐나다·미국의 일부 주는 허용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2월9일 열린 수요 일반알현 교리 교육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죽음을 유발하거나 자살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제도로 ‘호스피스제도’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있지만 여론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국내 호스피스 병동 이용률은 암 환자 기준 2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 역시 약 130만명으로 성인 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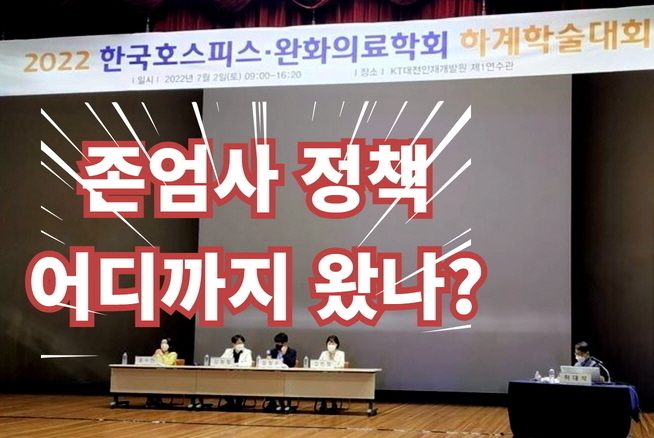
반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영국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률이 무려 95%에 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조력 존엄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단순히 찬성과 반대에 얽매인 논쟁으로만 흘러 자칫 사회적 갈등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법제화하기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체계 안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거에 비해 동의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결정하고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운영 중인 연명의료 중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범주 안에서도 우리가 개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치 또는 제도를 갖고 있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여론조사 찬반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락사 #존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