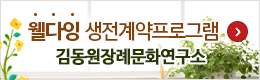지난 7월 1일 문을 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한달이 지난 현재,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서고 있다.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과 다수 지자체간의 이해충돌 등 우여곡절 끝에 지자체간의 협력, 자자체와 주민과의 햡상 성공 등 국내 장사정책의 모범으로 손꼽을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일 문을 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한달이 지난 현재,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서고 있다.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과 다수 지자체간의 이해충돌 등 우여곡절 끝에 지자체간의 협력, 자자체와 주민과의 햡상 성공 등 국내 장사정책의 모범으로 손꼽을수 있게 됐다.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장후 화장장 문제로 지역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부천시와 안산시 등 사업참여 지자체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된 사실에 뿌듯해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장식에서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안양시민은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화장 비용의 60~70%를 지원해온 부천시와 안양시는 함백산추모공원 개장에 따라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화장장려금을 없애기로 했다.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맡고 있는 이호진 화성도시공사 팀장은 "수도권의 타 화장장에 비해 최신 시설과 뛰어난 조경 등을 갖춰서인지 개장 당일부터 예상보다 많은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화성시를 비롯해 안산, 부천, 안양, 광명, 시흥까지 6개 지자체 383만여명의 시민이 관내이용료(어른 16만원)로 이용하는 만큼 화장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개장 이후 안양·시흥·광명은 물론 제주·여수 등 관외 이용자도 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13기의 화장시설을 갖췄지만 예비용 1기를 뺀 12기 가운데 현재 8기만 가동 중이다. 1기당 4회씩 하루 최대 32회 화장이 이뤄지는 셈이다. 화장장보다 봉안당과 자연장 수요가 더 많다.
한편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개장 초기 운영미숙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은 고급스럽고 쾌적하면서도 일부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던 점도 있다. 이호진 팀장은 "개장 초기에 일부 미숙한 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보완했고 부족한 인력도 채용 중"이라며 "무엇보다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의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이 정착되기까지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업 부지로부터 2㎞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법정 다툼으로 번졌지만, 2018년 10월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서 기각해 2019년 1월 착공했다.
특히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 등 서·남부권 6개 지방자치단체 주민 383만여 명의 숙원이던 광역화장시설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지방자치 상생협력의 모델이면서 주민 공모를 통해 님비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추모공원은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부지 30만1146㎡ 규모로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자연장지 2만5300기 ▲ 봉안시설 2만6514기▲ 문화시설 ▲주차장 식당 등 부대시설로 조성됐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213억5000만 원을 포함해 1714억 원으로 인구 수를 기준으로 6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했다.
그동안 6개 지자체에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하는 불편은 물론 비싼 장례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졌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6개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16만 원이며, 그 외 이용자는 100만 원이다.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그리고 공통시설은 6개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는 반면,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화성시가 단독 관리한다.
공원 내 식당과 매점, 장례식장은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맡아 운영한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혜택을 유치지역 주민과 참여 지자체들이 투명하게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주민과의 분쟁은 옥에 티
한편, 추모공원 개장 당일, 숙곡1리 일부 주민들이 행사장 진입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시가 약속한 마을발전지원금 수혜대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제공하기로 한 마을발전 지원기금 50억 원과 추모공원 내 수익시설 운영권과 관련해 유치지역인 숙곡리 마을주민 124세대 모두가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 중 50여 세대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체'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마을발전지원금이 주민들간 분란의 씨앗이 돼버렸다.
이학원 마을주민 대표는 "함백산 추모공원이 가동되면 마을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 그 중 절반도 안 되는 일부 50여 세대만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14세대 주민 모두가 지원 받도록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