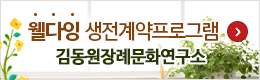우리가 살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멈추고 끝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데이터로 기록되어져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디지털 기록 처리 문제로 2004년 11월13일 미국의 이라크 참전 용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의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발생으로 전사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문제가 언론에 부각되었다.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멈추고 끝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데이터로 기록되어져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디지털 기록 처리 문제로 2004년 11월13일 미국의 이라크 참전 용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의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발생으로 전사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문제가 언론에 부각되었다.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자신만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유족은 물론 살아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밀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비밀에 재산상의 이해관계나, 가정불화 적 요소, 심하면 국가적 안위에 관계된 비밀도 포함될 수 있어 죽음 전에 그 처리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 왜곡된 콘텐츠나 악성 댓글을 지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본인이 모든 개인 정보를 미리 정리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경우 지울 수 없으므로 망자의 개인 정보가 오용, 망자의 명예훼손, 금융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후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는 갈수록 증가하여 전체 국민 중 88%가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51.4%가 넘는 환경을 감안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생산한 영역의 많은 콘텐츠와 메일이나 카페, 게시판 등의 사전 정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변을 정리할 때에 빼놓지 않고 점검해야 할 디지털 관련 유산이다.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사물인터넷(IOT)은 주변 모든 변화를 데이터로 만들어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사물인터넷 이용의 경우 집안의 창문이나 가전제품의 작동과 자동차 등의 움직임은 물론 CCTV 카메라까지 마음대로 해킹하여 비밀스런 사생활 모습을 인터넷상에 떠돌게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사물인터넷(IOT)은 주변 모든 변화를 데이터로 만들어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사물인터넷 이용의 경우 집안의 창문이나 가전제품의 작동과 자동차 등의 움직임은 물론 CCTV 카메라까지 마음대로 해킹하여 비밀스런 사생활 모습을 인터넷상에 떠돌게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사망한 회원의 사후처리방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가입한 회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사망한 회원에 관한 정보 및 사망한 회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그 상속인에게 제공해야 할 근거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회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관 규정도 없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개인 정보는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정보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망자의 정보를 유족이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 대상이 되는 본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본인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인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이 부당한 피해를 받을 위험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는 0,03%내외의 미미한 율이지만 이는 전체 사망자의 81.4%(2016년 통계)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 정보의 빅데이터 관련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수년 전의 나의 일정과 행동 등, 모든 정보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의 모든 정보가 그대로 남겨진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며, 더 이상 사생활이 사적일 수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죽음은 결코 홀가분할 수 없다.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쏟아냈던 오물과 독소는 스스로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성숙한 뒷모습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앞서 이야기한 이라크 참전 전사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CD등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아니면 삭제할 수 없다는 판결로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졌다. 이 부분에 대한 법조계의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떠난 후의 자리가 깨끗해야 진정 아름다운 삶이다. 세월이 가면 잊혀 질 나의 존재는 데이터 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떠돌 것을 생각하면 잊혀주길 바라는 것과 남겨져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로운 정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쇠잔해지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가물거리기 전에 정리의 고민을 해야 한다. 여기저기 걸쳐놓았던 각종 포털 사이트와 카페, 블로그 등의 SNS, 금융기관, 홈쇼핑 등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파편 같은 글들을 청소하고 삭제, 탈퇴까지 정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고 :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전문위원 변 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