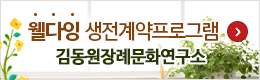고려장 악습은 미국인 그리피스가 쓴 '은자의 나라 한국'에 처음 소개된다. 일본에 머물던 1882년에 쓴 이 책은 고대 한반도에서 노인을 산 채로 묻는 고려장이 성행했다고 적었다. 그리피스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데다 고려장 출처도 제시하지 않아 신뢰도는 매우 낮다. 설화를 한국 역사인 양 둔갑시켰을 개연성이 크다. 고려장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시기는 일제 강점기다. 일제가 기로 설화를 동화책 등에 수록해 퍼트렸기 때문이다.
조부를 산에 두고 떠나는 아들에게 손자가 나중에 아버지를 버리는 데 필요하다며 지게를 챙기려 하자 아들이 불효를 뉘우치고 봉양했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는 중국 효자전에 실린 원곡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수레가 지게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판박이다. 식민지배와 도굴을 정당화하려고 일제가 고려장 설화를 악용했다는 학설도 있다. 문화적 열등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며 패륜 잔재인 무덤은 파헤쳐도 된다는 꼼수를 만들려는 차원에서다. 일제가 주도한 일종의 의식화 교육인 셈이다.
고려(918~1392) 법률도 고려장 풍습과 맞지 않는다. 충효 사상을 거스르는 반역죄와 불효죄를 중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왕족이나 귀족과 달리 민간 장례 풍습은 매우 특이했다. 천수를 누린 사람이 죽으면 상가에 춤과 노래가 등장한다. 이런 풍습을 보여주는 놀이문화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상여를 앞세워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놀이가 그런 사례다. 지역별로 이름이 제각각이지만 놀이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황해도는 생여도듬, 강원·경기·충청도는 손모듬이나 걸걸이, 경상도는 개도둔, 전라도는 대뜨리 등이다. 장례일 전날 밤 슬픔에 잠긴 상주를 웃기려고 재담이나 노래,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풍습도 있다. 이런 전통은 전남 진도에서는 다시래기라 불리며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돼 있다. 진도는 몽골 침략에 맞선 고려 삼별초가 장기 주둔한 곳이다. 축제 형태의 장례문화는 고구려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 수나라 역사서에 "고구려에서는 북 치기와 가무로 죽은 분을 떠나보낸다"라는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