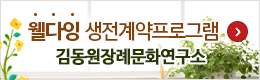연구원은 "선진국에선 자국민 중심에 최적화된 노화연구 결과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노화관련 질환의 분자 기전 및 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기초적인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화 대응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기초·응용임상연구 기반 확립 및 역학 임상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 전주기적 연구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며 "항노화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선 임상 수요를 반영한 중개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노화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정보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다부처 협력기반의 융합형 R&D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노화대응 및 건강노화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신흥국가의 빠른 성장 및 산업화 속도 추세에 비례해 관련 시장의 대폭 확대가 전망된다"면서 "노화 대응 의약품 산업은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독 가속화에 따른 생체기능 저하 및 질환 발생 확률 증가로 모태산업(의약품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질병이나 환자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화임상과 연구정보의 수집, 체계화 및 제공방안을 위한 기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