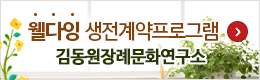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변사자는 검시관이 먼저 =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시관 운용규칙을 새로 만들어 변사사건의 경우 검시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사자의 이동을 금지시켰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 과학수사요원은 현장감식, 검시관은 사체 검시를 한다. 이들의 의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은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번 1기 검시관은 간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생명공학 박사, 제약회사 연구원 등으로 일하던 전문가들이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에 배치된 배진웅 신미애 이현정 검시관은 그동안 100건의 변사사건을 통해 115구의 사체를 검시했다. 임경택 서울경찰청 검시반장은 “사체 감식은 경찰보다 검시관이 보는 게 더 정확하다”며 “지난 6월에 온 3명의 검시관이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할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제 막 출발한 검시관 제도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검시관들은 “우리의 소견이 재판 과정에 참고자료로 채택되지도 않는다”며 “전문가로서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니폼이 없어 경찰복을 입고 근무하거나 경찰과 함께 일하면서도 각종 수당이 없는 점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 독려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 신미애(여·31)검시관은 “변사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약자를 많이 보게 됐다”며 “죽음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이현정(여·31)검시관은 “의뢰받은 감정물을 분석하면서 현장이 늘 궁금했다”며 “현장과 결합한 정확한 분석으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경찰청은 한해 평균 2만8000여건 발생하는 변사 사건 현장에 검시관을 빠뜨리지 않고 보내기 위해 검시관 1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8명을 선발했고 내년에는13명을 뽑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