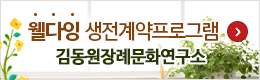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 ▶장교 ‘초만원’… 사병도 3년 뒤 안장 못해 ▶“조성비 덜 들고 친환경적” 수목장림 검토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하나 열렸다. 1982년 이곳에 처음으로 안장이 이뤄진 이후 5만번째 안장식이 거행된 것이다. 현충원 측은 사병묘역에 안장된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인 고 조근행씨의 유족에게 ‘5만번째 안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현충원 측에 큰 숙제를 남겼다. 6만3218명을 안장할 수 있는 이 국립묘지가 거의 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묘역은 1만3000여명을 안장할 수 있는 정도다. 해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이는 5000여명.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사병묘역 등 수요가 많은 묘역은 더 이상의 안장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
국립묘지가 이렇게 급속도로 만원을 이루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전쟁·베트남전쟁 참전장병 등 유공자들이 70~80대 고령자가 되면서 최근 3~4년 사이에 안장자 수가 급증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군·경·독립유공자 등 이곳에 안장되는 사람 1명당 1개의 묘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군·애국지사 등에게는 1명당 8평의 묘지가, 사병·경찰관 등에게는 1명당 1평의 묘지가 각각 배당된다. 장군·애국지사 등은 시신을 그대로 묻을 수 있지만 사병·경찰관 등은 화장한 유골을 묻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묘지가 만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 대전현충원 장홍석씨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3년 안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등 유공자들이 잠들 곳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수목장은 어떨까 =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전현충원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충원 내부에서는 묘역을 추가 개발해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납골당 형식의 봉안당을 건설하는 방안,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묘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안당 건립안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현충원은 최근 수목장 전문가를 초청, 수목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현충원 관리담당 이종하씨는 “현재 보훈처와 함께 수목장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은 수목장림을 시범적으로 조성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현충원 부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소나무숲)를 활용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숲을 조금 다듬어서 수목장림으로 만들고 그 앞에 공동제단과 명패를 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충원 측은 “이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묘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목장이 아직 보편적 장묘문화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 따라서 이곳에 묻힐 유공자와 유족들이 수목장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수목장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변우혁 교수는 “국립묘지의 안장 방식을 전환한다면 납골당보다는 환경적 가치가 높은 수목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수목장림을 조성한 뒤 유가족들이 묘지와 수목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