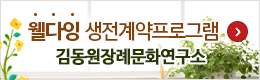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 조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법의학서인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과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명시 규정대로 엄격히 검시(檢屍)해야 했다. 살인사건이 접수되면 지방 수령은 관아의 오작을 거느리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데, 시신검사관인 오작이 바로 조선의 CSI였다. 수령은 현장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한 후 공개리에 시신(屍身)을 검안(檢案)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후좌우로 세밀히 검사해 검안기록서인 시장(屍帳)에 기입했다. 대한제국 광무(光武) 1년(1897) 강원도 회양군(淮陽郡) 장양면(長陽面)에서 문소사(文召史)라는 여인의 치사(致死)사건이 발생했다. 금성군수(金城郡守) 한병회(韓秉會)는 남편 서광은(徐光殷)과 시아버지·시어머니, 어린 아들과 마을 책임자인 집강(執綱), 가까운 이웃 사람들까지 입회시킨 후 검시했다. 첫 번째 검시인 초검(初檢)은 해당 지역의 수령이 수행하고, 두 번째 검시인 복검(覆檢)은 이웃 군현의 수령이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회양군에서 발생한 치사사건을 이웃 금성군수가 보고한 것이다. 오작은 영조척(營造尺)과 독살 사건 전용 은비녀 등의 기구를 가지고 검안하는데, "신주무원록"은 중독(中毒)의 경우 "배를 갈라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오장(五臟)이 모두 녹아내려 있었다"고 때에 따라 부검도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검시 후에는 가족들의 원통함이 없는지 시장(屍帳)에 기입해야 했다. 가족들이 수긍하지 않는데도 그냥 보고를 올렸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승정원일기" 숙종 23년 9월 조는 충청도 연풍현(延?縣)에 정배되었던 죄인(罪人) 최동길(崔東吉)이 심문을 받다가 물고(物故)되었는데, 시장에 오작의 서명 날인이 없었다. 승정원은 충청감사 신후명(申厚命)의 추고(推考)를 청했고 숙종은 즉각 허락했다. 일개 죄인의 죽음에 감사를 처벌한 것이다. 원통한 죽음이 하늘을 움직여 재해를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검시(檢屍)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했다.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 조선에도 그 못잖은 전문가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