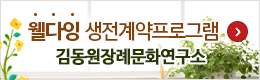고려 24대 왕인 원종의 비 "순경태후"가 잠든 "가릉"에서 북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화려한 능이 하나 있다. 진강산 능선이 부드럽게 뻗어내린 곳에 위치한 "능내리석실분"은 그러나 아직 누구의 묘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크기나 출토유물로 미뤄 왕실의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만이 있을 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7년 발굴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도굴된 채 구릉으로 뒤덮여 있었다. 능내리석실분의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것은 "난간석"이다. 뛰어난 건축미를 보여주는 난간석은 무덤 뒷부분 180도 정도만을 두르고 있다. 앞의 부분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덤을 보호하는 얕은 언덕인 곡장이 화강암으로 돼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3단의 석축으로 이뤄진 능내리석실분에선 "ㄷ"자형 건물지도 눈에 띈다. 두 개의 "석수"는 무덤의 난간석 바깥을 향하고 있다. 하나의 석수 머리엔 반달형의 홈이 패여 있다. 뿔이 있었던 자리처럼 보인다. 이 석수는 해태로 추정된다. 해태는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로 여겨져 궁궐에 주로 장식되던 동물이다. 다른 하나의 석수는 석구의 형태로 귀와 눈, 코, 입이 해학적으로 보인다. 이곳은 과연 누구의 무덤이란 말인가. 능내리석실분은 바로 아래 남서쪽 방향으로 있는 가릉에 비해 규모가 크다. 난간석이나 화강암곡장은 다른 능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능내리석실분은 왕실의 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고려왕릉은 묘역과 봉분, 석실로 구분되며 봉분은 원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봉분자락에는 12지상을 새긴 병풍석을 돌리고 그 주위에는 난간을 돌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무덤 주위 사방으로는 문인과 무인을 상징하는 "석인"이나 사자나 양 호랑이, 해태, 개와 같은 "석수"를 배치하기도 했다. 석수와 석인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담당한다. 강화에 있는 홍릉, 석릉, 곤릉, 가릉의 경우 12지상을 새긴 병풍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고려정부가 개경에서 강화로 천도를 한 데다 몽고와의 전투상황이라는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강화의 왕릉은 현재 북한에 있는 고령 왕릉에 비해 축조 수준과 방식이 단순화된 경향을 보인다. 석실의 평면은 대부분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돼 있으며 지하나 반지하식으로 돼 있다. 석실의 벽돌은 거의 수직으로 쌓아 올렸으며 잘 다듬은 장대석이나 다듬지 않은 할석이 모두 사용됐다. 천장은 대부분 평평한 면으로 구성됐다. 보통 3장의 대형 석재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서·북벽과 천장에는 얇은 회칠을 하기도 했다. 일부 무덤에서는 벽화를 그려 넣은 경우도 있다. 강화에 남아 있는 고려왕릉은 석실의 규모가 개성의 것들과 비슷하지만, 봉분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가릉과 가깝게 있는 능내리석실분은 가릉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가릉의 경우 석실 안쪽의 벽석축조 당시 일부 기와조각을 사용했는데, 이들 기와가 능내리석실분의 건물지에서 사용된 기와와 똑같기 때문이다. 능내리석실분의 경우 고려왕릉의 축조방법을 따랐고 석실의 규모도 가릉보다 크다. 또 능선의 주맥에 해당되는 부분에 축조돼 있는 점으로 미뤄 가릉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묻혔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고려가 강화로 천도했던 강도(江都)시대(1232~1270)를 살다 사망한 고려왕실의 중요 인물은 적지 않다. 그러나 최우의 무덤을 비롯해 발견하지 못한 무덤이 더 많다. 아직은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고분군도 강화도에는 수두룩하다. 능내리석실분은 누구의 무덤일까. [인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