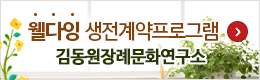| 한국종교문화연구소(소장 윤승용)와 충간문화연구소가 20일 오전 10시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죽음의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발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리 장례의 변화 요인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펼친 가정의례 간소화 방침과 1990년대 이후 확산된 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최근의 상조회사 등장 등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진홍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 죽음의식의 변화는 의미와 연계된 것이라기보다는 편의와 이어진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죽음 의례문화 전체에 대한 의미론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병원의 장례식장화와 그 변화의 사회적 의미〉를 발표하는 장석만 충간문화연구소장은 "이젠 집에서 별세해도 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객사(客死)" 개념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장례가 혈연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치러졌다면, 최근에는 교통과 서비스 등이 편리한 병원 장례식장이 대세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죽음 의식의 중심에 있던 상주(喪主)는 조문객의 부의금을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넘겨주는 소극적 역할로 바뀌었다"며 "과거 장례가 상주와 조문객이 망자(亡者)와 이별하는 의식이었다면 최근의 장례는 그 같은 의례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천도재(薦度齋)에 대해서는 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불교의 죽음의례와 그 변화양상〉이란 논문에서 분석한다. 그는 "백일 탈상(脫喪)은 부담스럽고 3일·삼우제 탈상은 아쉬운 현대인들에게 49재는 종교와 무관하게 사찰에 의뢰하여 치를 수 있는 간편한 탈상 의례로 적극 수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낙태아와 회갑·칠순·팔순을 맞지 못한 채 사망한 이, 자살자를 위한 천도재 등 특정 목적에 맞춘 천도재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의례들은 망자의 극락천도에 치중돼 죽음이라는 궁극적 사건을 계기로 성찰적 삶으로 이끄는 종교의례의 목적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윤용복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기독교 죽음의례의 변화양상〉이란 논문을 통해 "정부의 관혼상제 의식 간소화와 맞물려 기독교(개신교·천주교)의 상례(喪禮)가 장례의식의 간소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이용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 전통 죽음의례의 변화〉, 송현동 건양대 교수가 〈상조회사의 등장과 죽음의례의 산업화〉, 우혜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천도재의 새로운 양태〉란 주제로 발표한다. (02)886-2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