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각을 다투는 생과사의 경계선 "응급실" ●심폐소생거부하고 의연히 죽음 맞은 노인 인상적..... 지난 19일 새벽 3시를 막 지난 시각 서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갑자기 5번 베드의 비상경고음이 울렸다. 폐렴과 패혈증으로 치료중인 최욱현(가명) 환자의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환자의 호흡과 인공호흡기의 리듬이 어긋나 생긴 일이었다. 벌써 30일이 넘게 중환자실에 있지만 아직 누구도 그 환자의 생사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그가 갑자기 새벽에 쇼크를 일으킨 것이다. 담당의사에게 상태를 전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다시 세팅하고, 강심제와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20여분간의 사투(?) 끝에 환자는 두어 차례 가쁜 숨을 몰아 쉬더니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긴장 후에 엄습하는 돌덩이 같은 피로를 털며 의료진은 잠시 무거운 몸을 추스렸다. 창밖의 짙은 어둠 속으로 이른 새벽의 연무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세브란스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의 베테랑 간호사인 정현향(36) 책임간호사.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가 그녀의 일터이다. 이를테면 그녀가 있는 곳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인 셈. 중환자실이란 그런 곳이다. 저쪽 문으로 나가면 영안실이고, 이쪽 문으로 나가면 회복실이다. 이런 중환자실에서 그녀는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른다. “처음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어요. 전문교육을 받았고, 병원에 들어와 지금까지 줄곧 중환자실만 지켜왔으나 한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두려운 곳이지요. 항상 중압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그럴수록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탱탱하게 긴장시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곳이 중환자실이거든요.” 간호사 생활 14년째. 그녀는 이 14년을 오로지 중환자실에서만 보냈다. 그런데도 중환자실은 그녀에게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곳이란다. 이곳의 수많은 ‘앓는 영혼들’을 지켜야 하는 일, 이보다 더 진지해야 하고, 성실해야 할 일이 따로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지냈나 싶어요. 환자들의 고통에 애간장이 타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수많은 경고음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되풀이되는 이런 살벌함을 헤쳐왔다는 게 가끔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요.” 간호사의 고통은 이것만은 아니다. 1일 3교대로 돌아가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그녀의 생활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예컨대 그녀의 출근이 10분 늦으면 전임자의 퇴근이 그만큼 늦어진다. “나 때문에 두 딸의 생활이 덩달아 3교대로 돌아가야 할 때는 엄마로서 정말 가슴 아프지요.” 그러나 이런 힘겨움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됐다. 문제는 환자들을 겪으면서 겪는 상처다. 지금까지 간호사로 생사의 현장을 누빈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녀의 눈앞에서 삶을 마감한 환자만 어림잡아 1000명이나 된다. “어느 하나 아깝지 않은 죽음, 슬프지 않은 죽음이 없지요. 처음 환자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가슴이 저려 종일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슬픔에 마냥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봐야 할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이런 게 직업의식인가 봐요.”잠을 쫓아가며 환자를 살펴야 하는 직업, 식사시간이 10분을 넘으면 스스로 불안해지는 직업, 그래서 소화불량과 방광염 같은 질환을 달고 사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한두가지랴만 그래도 가슴에 남는 환자는 따로 있다. “3년쯤 전의 일이에요. 일곱살 난 여자애가 폐섬유종으로 이곳에서 숨졌는데, 뒤이어 그의 남동생이 같은 병으로 이곳에서 짧은 생을 접었던 일, 그 둘의 주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몄는지….” 그러나 슬프지만 아름다운 죽음도 있다. 중환자실 파트장인 김정연(36) 간호사는 이런 사연을 소개했다. “7∼8년쯤 됐나요. 폐암이 뇌종양으로 전이된 할아버지 한분이 이곳으로 오셨는데, 너무 인자하고 의연했어요. 언제 숨을 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시더니 어느날 밤, 저와 대화를 나눈 뒤 정말 잠든 듯 운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의 생애 마지막 대화자였는데, 그 대화를 가족들과 나눴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저릿해지곤 해요.” 이런 그들에게는 와닿는 삶의 의미도 각별할 수밖에 없다. 정 책임간호사는 “이미 의학적 처치가 별 의미가 없는 환자를 병원으로 모셔온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떼쓰듯 할 때는 솔직히 안타까워요. 환자가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미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절대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김 파트장도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에 이른 환자를 대책없이 병원에 놔두는 건 치료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병원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라고 여길 때도 없지 않다.”며 “중환자실에서 환자와 말 한마디 못 나눈 채 사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으로 모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게 더 의미있다.”고 털어놨다. 그들과의 대화는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단속적이었지만 흥미롭고 진지했다. “물론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처음엔 가망없다고 여긴 환자가 멀쩡하게 회복해 일반병실로 가시더니 나중엔 휠체어를 타고 저흴 찾아 오셨어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그 분을 환대했던 기억, 그런 일이 보람이겠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로서 바람이 많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것은 스스로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가족에게 미루기보다 미리 결정해 놓으면 한 자연인의 종말이 더 아름답고 의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시 일이 터졌다. 새벽 4시15분을 막 지난 시각. 다발성 장기부전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 비상이 걸렸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한 가운데, 담당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정 간호사는 서둘러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고는 앰부 배깅(Ambu-Bagging)을 시작했다. 의사가 오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응급심폐소생술(CPR)이다. 다행히 환자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들은 깊은 안도의 얼굴로 새벽의 여명을 맞았다. [서울신문]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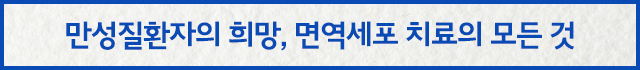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 1 파묘,묫바람,첩장,대살굿,혼부르기,도깨비놀음,풍수사,장의사
- 2 2024 일본장례문화견학연수 일정 및 신청
- 3 내사업의 현주소는 어디 쯤일까?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 4 웰다잉 스낵바, 크라우드펀딩 181% 달성
- 5 [세계는지금] 일본 반려동물장례산업 현황
- 6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 7 일본장례문화연수③ 반려동물장례사업 가이드 등
- 8 반려동물 장례시장 확대, 대형 상조업체 진출 현황
- 9 여행작품공모전,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 하이라이트
- 10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계기, 케이셀바이오 활약 기대

